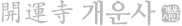| 종목 | 시도유형문화재 89호 |
|---|---|
| 명칭 | 보타사마애불 (普陀寺磨崖佛) |
| 분류 | 마애불(부동산) |
| 수량 | 1좌 |
| 지정일 | 1993.04.03 |
| 소재지 |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7 |
| 소유자 | 학교법인승가학원 |
| 관리자 | 학교법인승가학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개운사의 암자인 보타사 대웅전 뒤쪽 화강암 암벽에 조각된 고려시대의 마애불상이다.
이 불상은 1992년 서울문화사학회가 정기 답사 때 발굴한 것으로 높이 5m, 폭 4.3m의 거대한 보살상이다.
머리에는 좌우 옆으로 뿔이 있는 관을 쓰고 있으며, 뿔 끝에는 복잡한 타원형의 장식이 늘어져 있다. 얼굴 생김새가 토실토실하며 어깨가 넓고 웅대한 형상을 하고 있다. 비교적 자연스럽고 미감이 풍부한 표정이며 옷은 양 어깨를 감싼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최근에 온 몸을 흰색으로 칠하여 백불(白佛)의 인상을 풍기는데, 입술은 붉은색, 눈과 눈썹, 윤곽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마애불 어깨쪽의 좌우에 홈이 패여 있는 것으로 보아 불상을 보호하던 전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애불 오른쪽 아래에는 제작 당시에 새겨진 명문(銘文)이 남아있다.
보타사는 개운사(開雲寺)에 속한 암자로서 개운사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타사의 대웅전 뒤에 있는 커다란 바위면을 'ㄱ'자 형태로 깊게 파고 그 안에 보살상을 새겼는데 측면에서 보면, 벽면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위쪽에는 자연석의 보개(寶蓋)가 늘어진 형태로 되어 있다.
현재 마애불 앞에는 대웅전이 있지만 이 마애불상이 새겨진 바위면 좌우에 구멍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애불을 중심으로 별도의 목조 전각(殿閣)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낮은 부조로 새겨진 이 마애불상은 몸전체에 호분(胡粉)이 칠해져 있어서 흔히 '백불(白佛)'이라고도 부른다. 이처럼 불상에 호분을 두껍게 칠한 백불의 예로는 고려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서울 홍은동 보도각 마애보살좌상과 안성 굴암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이 불상들은 갸름하면서 약간 살이 붙은 얼굴과 옷자락 사이로 주름들이 형식적으로 흘러내린 점등에서 양식적으로 거의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보타사 마애보살상이 새겨진 바위면은 보도각의 마애보살상 보다 더 굴곡져 있어 고개를 약간 숙인 얼굴이나 신체의 부드러운 선들이 바위 면을 그대로 이용한 듯하다.
이 마애보살상은 5m에 이르는 거대한 불상으로 두 다리를 포개어 결가부좌한 자세로 앉아 있다. 머리 위에는 원통형의 보관(寶冠)을 쓰고 있는데 관대(冠帶)의 좌우에 늘어진 복잡한 장식이나 목걸이와 팔찌, 그리고 얼굴의 이목구비에 칠해진 채색 등이 흰색의 호분과 함께 화려하면서 장식적인 느낌을 준다.
보살의 대의(大衣)는 모두 호분으로 칠해져 쉽게 구분되지 않지만 양어깨에 가볍게 걸쳐져 있으며 특히 왼쪽 가슴을 가로지르는 스카프 형태의 천의가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표현되어 있다.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올려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맞대었고 왼손은 무릎 밑으로 내려 엄지와 셋째 손가락을 맞대고 있다.
이 불상은 크기가 매우 크면서 특히 벽면 자체의 굴곡이 마애불의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것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에서 조성되었던 고려 후기 마애불상 중의 하나이다.
마애불상의 왼쪽 편으로 '나무금강회상불보살(南無金剛會上佛菩薩)' 등이 새겨진 원패(願牌) 모양의 장식이 보인다.
원패는 원래 부처ㆍ보살의 이름을 적어 불단 위에 놓는 목제 장식물로 마애불상 옆에 새겨져 있는 점이 흥미롭다.
원패는 시대마다 유행된 문양이 다른데 이 마애불의 원패처럼 연꽃 받침과 연잎이 장식된 직사각형 형태는 고려시대 사경(寫經)의 표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불상의 이름을 보타사마애보살좌상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 보타사 마애불 전경 >
한국 현대 불교시인의 계보
그들에게 불교는 전통과 근대를 이을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종교였다.
그들의 시각에서 불교는 철학적 성격과 종교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근대사상과 근대과학을 포용할 만한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식민지의 많은 지식인들은 불교를 매개로 조선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동양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 전통과 근대를 변증시키고자 하였다.
문인이 곧 지식인으로 인식되던 식민지 시대에, 많은 문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한편으로 불교계는 교육에 힘을 쓰면서, 교육기관을 통해 문인들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1923년부터 1948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조선불교 교정(敎正)이었던, 박한영(1870~1948) 선사는 불교계열의 문인을 양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미당은 박한영 선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석전 박한영 스님 하면 사람들은 저 1923년으로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948년까지에 이르는 25년 동안 우리나라 불교의 최고대표자인 교정 스님이었던 걸 기억하고, 또 지금의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오랫동안 교장이었던 것, 또 저 1911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세로 불교까지 합병하려 했을 때 그 부당한 걸 끝까지 주장하여 기어코 이걸 못하게 했던 스님인 것, 또 그가 우리 신문학의 문인들 속에서도 춘원 이광수를 비롯하여 육당 최남선, 신석정(辛夕汀), 조종현(趙宗玄)과 필자 등의 직계 제자들을 가진 사람인 것, 춘원 이광수의 머리를 중대가리로 박박 깎게 한 것도 바로 그였던 것 등을 잘 기억해 말들 해 내려오고 있다.
― 서정주 <내 뼈를 덥혀준 석전 스님>
박한영 선사가 교장으로 몸담고 있었던 중앙불교전문학교는 식민지 시대 불교문학의 정신적 거점 역할을 한다.
중앙불교전문학교는 현재 동국대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06년에 허가 받은 명진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점기 한국불교계의 전문교육기관은 명진학교에 뒤이어 다음과 같이 개편·개명되면서 명맥을 이어나간다.
불교고등강숙(1914)→중앙학림(1915)→중앙불교전수학교(1928)→중앙불교전문학교(1930)→혜화전문학교(1940)― 강석주·박경훈 《불교근세백년》
혜화전문은 1944년 일제의 탄압으로 문을 닫았다가, 해방과 더불어 동국대학이라는 교명으로 개교를 하고 이후 동국대학교로 개칭한다. 식민지 시대 불교계는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에 크나큰 열정을 보이면서, 한국 현대문학사에 빛나는 시인들을 여럿 배출하였다.
한국 현대불교문학의 비조(鼻祖)라 할 수 있는 한용운(1879~1944)은 당대 불교 교정인 박한영에게 큰 감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해는 명진학교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1918년 중앙학림 강사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서정주(1915~2000)는 중앙불교전문강원에서 수학한 바가 있다. 그는 1933년 박한영의 문하생으로 입문하여, 개운사 대원암 내 중앙불전에 입학하였다. 이후 서정주는 박한영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모신다.
한국 현대 불교 문학사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김달진(1907~1989)이 있다. 김달진은 1936년 중앙불전에 입학하여 1939년 졸업한다. 그러한 학력과 무관하지 않게 김달진의 시는 선미(禪味)로 가득하다.
조지훈(1920~1968)은 1938년 중앙불전에 입학하여, 1941년에 불전이 개칭된 혜화전문학교를 졸업한다. 김달진과 조지훈의 친소 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둘은 1938년 봄부터, 1939년 봄까지 함께 같은 학교를 다녔다.
당시 중앙불전 학생회에서는 회지 <룸비니>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김달진과 조지훈의 글이 함께 발표된 적도 있다.
그런데, 당시 회지에서 김달진은 이미 주요 잡지와 중앙일간지에 많은 작품을 발표한 기성시인으로서 여러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조지훈의 선적인 작품들을 보면 김달진의 상상력과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조지훈이 김달진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
한용운, 김달진, 조지훈, 서정주 등은 불교적 시학을 전개하면서 우리 현대시사에 큰 족적을 남긴 시인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중앙불전과 직·간접적으로 연을 맺으면서 우리 현대시사에 독특한 계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 글은 한용운, 김달진, 조지훈, 서정주 등의 산문과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시의 불교적 상상력의 몇 가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과 근대의 변증 - 한용운
남아에겐 어디나 고향이라네 男兒到處是故鄕
그 몇 사람이 오래도록 객수에 갇혀있는가 幾人長在客愁中
한마디 큰 소리가 삼천대천세계 깨뜨리니 一聲喝破三千界
눈 속에 복사꽃잎 붉게붉게 날리네. 雪裡桃花片片紅
― 한용운 <오도송(悟道頌)>
1917년 12월 3일 밤 10시경 설악산의 오세암에서 좌선을 하던 만해는, 갑자기 바람이 불어 무슨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고 의심하던 마음이 씻은 듯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지은 오도송이 이 작품이다.
여기에서 ‘객수’는, 우주의 광야에 선 자아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나는 누구인가?’나아가 ‘인간이란 무엇인가?’하는 질문과 통한다. 그러한 질문의 해답을 구하다 보면, 결국 ‘나’‘인간’이란 어딘가에서 떠나와 다시 어딘가로 돌아가는 나그네적 존재이다. 따라서 지상에서는 어디에서나 ‘객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마, 갑작스럽게 들리는 물건 떨어지는 소리는 그러한 ‘객수’를 순식간에 몰아내버린 모양이다. 만해는 갑작스럽게, 태양계가 갠지즈강변의 모래알보다도 많다고 하는 불교적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떠올렸을 것이다. 삼천대천세계의 우주론에서 자아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이면서 태양계보다 큰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주론적 깨달음은 경직된 현실의 구조를 파괴해버린다. 그러한 해체의 논리가 ‘눈 속에 복사꽃잎 붉게붉게 날리네.’라는 멋진 역설을 만들어낸 것이다. ‘눈 속의 붉은 꽃잎’이란 역사적으로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조국에 대한 열정, 그리고 더 넓게는 광활한 우주의 겨울 들판에 선 우주적 나그네가 얻은 깨달음을 상징할 터이다.
물론 그 깨달음이란 논리와 언어를 초월한 것이므로, ‘눈 속의 붉은 꽃잎’이라는 역설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만해는 승려이자, 불교학자였으며, 근대사상가이기도 하였다. 동시에 한시와 자유시를 자유자재로 넘나든 시인이기도 하였다. 만해는 한국 사상사와 시문학사의 전통과 근대 사이에 놓인 튼튼한 교량과 같은 존재다.
만해는 불교와 근대, 종교와 과학을 매개하고자 하였다. 그는 불교를 토대로 근대사상과 과학을 해석하고, 불교가 근대나 과학과 상극이 아니라 쉽게 융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그러나 철학이 동서고금에 있어서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온 내용이 기실 불경(佛經)의 주석 구실을 하고 있는 데 불과함은 새삼 논할 필요도 없는 일이겠다.
② 근세의 자유주의(自由主義)와 세계주의(世界主義)가 사실은 평등한 이 진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그렇다면 금후의 세계는 다름 아닌 불교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
《조선불교유신론》에서 한용운은 동서고금의 철학은 기실 불경의 주석에 불과할 정도로 불교 사상이 넓고 깊다고 말한다. 나아가 근대에 와서 팽배해진 자유주의와 세계주의는 사실 불교의 평등사상의 연장선에 놓인다고 보았다.
만해에게 자유와 평등은 근대의 이대 사상인데, 이는 이미 부처께서 설해놓으신 불교의 이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만해는 ‘이후 문명의 정도가 점차 향상하여 그 극에 이르는 날이 오면’ 불교의 이념이 ‘장차 천하에 시행될 것임은 새삼 논할 여지가 없는 줄 안다.’고 말하였다. 문명과 역사가 발전하다보면 종국에는 부처님의 세상에 이르게 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불교의 토대에서 근대사상을 이해한 것과 유사하게 만해는 불교 사상의 토대에서 근대적인 자유시를 펼치기도 하였다.
그 문학적 성과가 바로 《님의 침묵》이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긔룬것은 다님이다 衆生이 釋迦의 님이라면 哲學은칸트의님이다 薔薇花의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님은 伊太利다 님은 내가 사랑할아니라라 나를사랑하나니라 戀愛가自由라면 님도自由일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조은 自由에 알한拘束을 밧지안너냐 너에게도 님이잇너냐
잇다면 님이아니라 너의그림자니라
나는 해저문벌판에서 도러가는길을일코 헤매는 어린羊이 긔루어서 이 詩를쓴다
― 한용운 <군말>
만해는 1925년 설악의 깊은 산중에 있는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탈고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회동서관에서 한 권의 시집으로 발간하였다. 그의 나이 47세 되던 해였다. 《님의 침묵》은 지천명을 바라보는 스님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여성적인 감성이 깊이 아로 새겨져 있다. 여성적인 어조나 상상력에는 당시에 번역되었던 타고르의 영향이 상당히 드러난다. 그러나 만해의 작품에 깃들어 있는 고유한 특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님의 침묵》의 ‘서시’에 해당하는 <군말>에는 만물을 부처로 보는 불교의 사상과 근대의 자유사상에 대한 인식이 뒤섞여있음이 쉽게 드러난다. 한시를 쓰면서 동시에 자유시를 풀어놓으며 전통과 근대를 한 몸 안에 지녔던 만해의 《님의 침묵》에서는 불교와 근대사상을 변증시키면서 자신의 시적 상상력을 풀어놓았다.
작은 자아의 고독과 자비 - 김달진
고인 물 밑
해금 속에 꼬물거리는 빨간
실낱 같은 벌레를 들여다보며
머리 위
등뒤의
나를 바라보는 어떤 큰 눈을 생각하다가
나는 그만
그 실낱같은 빨간 벌레가 되다.
― 김달진 <벌레>
화자는 물 밑 바닥에서 꼬물거리는 빨간 벌레를 들여다본다. 물 밑의 바닥은 빨간 벌레의 우주로서 삶의 터전이다.
벌레는 화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우주에서 자신의 삶을 영유하고 있다. 시적 자아는 벌레와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과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큰 눈’의 관계를 유추해낸다. 그러한 유추적 상상력을 통하여 시적 자아는 빨간 벌레와 동일화되어 버린다. 벌레와 대비될 때에 화자는 무한이 부풀려진 거대한 존재가 되지만, 역으로 ‘어떤 큰 눈’과 대비되는 경우에는 작은 자아로 축소된다.
깊은 밤 뜰 우에 나서
멀리 있는 愛人을 생각하다가
나는 여러 億千萬年 사는 별을 보았다.
― 김달진 <愛人>
화자는 깊은 밤 뜰에 나가서 멀리 있는 애인을 생각하다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본다. 표면적으로 밤하늘의 별은 멀리 있는 애인의 은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억천만년’과 결합하면서 우주적인 상상력으로 확장된다.
즉, 멀리 있는 애인은, 억천만년 전의 우주에서 연을 맺었던 애인에 대한 회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불교적 우주론에 윤회론적 상상력이 결합한 것이다. 불교적 사유체계에서 우주는 무한하며, 영원히 윤회하는 자아는 무한한 겹으로 이루어진 우주를 순회한다. 그러한 사유체계에서 생성되는 이 시의 상상력은 우리의 영혼을, 무한히 떨어진 별에 거주하는 억천만년 전의 애인에 대한 회상으로 이끌어준다.
시적 주체는 끊임없이 광활한 우주를 상상한다. 광활한 우주 안의 자아는 한편으로는 커다란 자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자아로 인식된다. 그러나 김달진 시에는 작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이다.
묵은 책장을 뒤지노라니
여기저기서 기어나오는 하얀 벌레들
나는 가만히 그들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고독과 적막의 슬픈 思想을
그들은 햇빛 아래 빛나는 이 세상 인정의
더욱 쓰리다는 것을 잘 아는 나의 어린 동무들입니다.
― 김달진 <고독한 동무>
<벌레>에서 빨간 벌레와 동일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하얀 벌레와 동일화된다. 시적 주체는 거대한 우주와 대조하여 자아를 축소시키면서, 고독과 적막의 정서를 생성한다. 여기에서의 고독과 적막은 광활한 우주 안에 한 점 티끌인 자아의 존재론적 위상과 관련된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작은 자아는 자신을 겸손하게 인식하면서, 우주의 모든 작은 존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우주의 미물들과 동체(同體)의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이 바로 동체대비(同體大悲)로서의 자비(慈悲)이다. 김달진 시의 구석구석에 깊이 배어 들어 있는 고독의 정서는 바로 불교적 자비의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오현 스님의 다음 시는 이와 같은 김달진의 불교-우주론적 상상력과 맥이 닿아 있다.
무금선원에 앉아
내가 나를 바라보니
기는 벌레 한 마리
몸을 폈다 오그렸다가
온갖 것 다 갉아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슬기도 한다
― 조오현 <내가 나를 바라보니>
선적 미학과 불교적 형이상학 - 조지훈
그 중에도 단순미의 큰 함정인 單調性을 초극하는 비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단순화·비범화·전체화는 시의 운문성·낭만성·상징성의 바탕이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의 背理를 찾아 전락한 현대시를 시의 正道에 환원시키는 길인 동시에 시대적인 요청으로서 우리 현대시를 전환시키는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단순화와 비범화와 전체화의 지향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禪의 방법이요, 선의 美學입니다. (중략) 내가 여기서 禪의 방법, 선의 미학이라 부르는 것은 현대시가 섭취한 것이 선의 사상 자체보다도 선의 방법의 적용이기 때문에 선의 미학이라고 이름지은 것입니다.
― 조지훈 <현대시와 선의 미학 - 시의 방법적 회의에 대하여>
조지훈의 역저, 《시의 원리》에서 주장하는 시의 근본 원리는 ‘복잡의 단순화’ ‘평범의 비범화’ ‘단면의 전체화’이다.
조지훈은 이 세 가지가 바로 선적 미학에 수렴한다고 말한다. 결국 조지훈은 시의 본질은 선과 통한다고 보았으며, 선적 미학의 정립을 통하여 근본에서 멀어진 현대시를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다음 시는 선적 미학의 ‘복잡의 단순화’ ‘평범의 비범화’ ‘단면의 전체화’를 가장 잘 반영한 작품이다.
순이가 달아나면
기인 담장 위으로
달님이 따라 오고
분이가 달아나면
기인 담장 밑으로
달님이 따라 가고
하늘에 달이야 하나인데……
순이는 달님을 다리고
집으로 가고
분이도 달님을 다리고
집으로 가고
― 조지훈 <달밤>
외관적으로 이 시는 동시(童詩)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평범한 인상을 준다. 실제로 이 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적도 있다. 그러나 평범 속에는 비범이 감추어져 있다. 그 비범은 불교적 형이상학과 연결된다. 달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현상적으로는 여럿이다. 그러한 상상력은 불성은 하나이지만 만물 속에 구비되어 있다는 불교적 형이상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평범 속에 비범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평범의 비범화’를 잘 구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복잡의 단순화’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 시는 부분과 전체, 본질과 현상이 엮여있는 우주의 복잡한 현상을 매우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우주의 복잡한 현상에서 모든 가지를 쳐내고, 단순화시켜 달이라는 이미지 하나를 통하여 불교적 우주론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 표현하는 것을 조지훈은 ‘복잡의 단순화’로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단면의 전체화’는 ‘복잡의 단순화’의 역순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시에서 달의 상상력은 단순히 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상징한다. 따라서 우주의 단면인 달의 이미지가 우주 전체의 원리를 반영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를 ‘단면의 전체화’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듯이, 이 세 가지 원리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겹쳐지고 엮여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리는 형식적인 차원이고, 좁은 의미의 선적 미학은 이 세 가지의 형식적 차원에 불교적 형이상학을 담고 있는 경우로 제한할 수 있다.
신라정신과 중생일가관 - 서정주
미당은 자신의 불교적 사유와 상상을 주로 《삼국유사》에서 이끌어낸다. 그리하여 자신의 불교적 상상력의 근원적 공간을 신라로 설정한다. 그에게 신라는 바로 불교국가이며 불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따라서 미당이 말하는 신라정신은 불교정신과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간단히 그 重要點만 말하자면, 그것은 하늘을 命하는 者로서 두고 地上現實만을 重點的으로 현실로 삼는 儒敎的 世間觀과는 달리 宇宙全體-卽 天地全體 不治의 等級 따로 없는 한 有機的 關聯體의 현실로서 자각해 살던 宇宙觀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高麗의 宋學 以後의 史觀이 아무래도 當代爲主가 되었던 데 反해 亦是 等級 없는 영원을 그 歷史의 시간으로 삼았던 데 있다. 그러니, 말하자면 宋學 이후 지금토록 우리의 人格은 많이 當代의 現實을 표준으로 해 성립한 現實的 人格이지만, 新羅 때의 그것은 그게 아니라 더 많이 宇宙人, 永遠人으로서의 人格 그것이었던 것이다.
― 서정주 <新羅文化의 根本精神>
미당은 자신의 고유한 불교정신으로서 신라정신을, ‘우주전체 - 즉 천지전체 불치의 등급 따로 없는 한 유기적 관련체의 현실로서 자각해 살던 우주관’이라고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불교적 세계관과 샤머니즘 - 주술적인 세계관이 지배적이던 신라에는 우주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관련체로서 통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유기적 관련체로서 우주에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자연과 인간이 전일적인 관계를 이루었다.
가령, 사람이 죽으면 새나 나무나 구름으로 윤회를 하면서, 인간과 자연은 혈연관계를 확보하였다. 그러한 세계관에서는 생명은 현생만이 전부가 아니라, 전생-현생-내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것이었다. 생명은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물질계·식물계·동물계로 순환하므로, 인간은 자연에 대해 형제애를 느끼고, 우주적인 윤리와 배려를 갖추어야만 했다.
미당은 그러한 세계관에 근거하여 삶을 영유해간 신라인을 ‘우주인’ ‘영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 이후 성리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하늘과 현실, 즉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당대만을 생명에게 주어진 시간의 전부로 여기고 인간사회의 윤리만을 중시하였다. 미당은 송학 전래 이후의 사람들을 신라의 ‘우주인’이나 ‘영원인’과 변별하여 당대의 현실만을 표준으로 해서 성립한 ‘현실적 인격’으로 못박는다.
미당은 그와 같은 역사의식을 다음과 같이 시로 표현한 바가 있다.
千五百年 乃至 一千年 前에는
金剛山에 오르는 젊은이들을 위해
별은, 그 발밑에 내려와서 길을 쓸고 있었다.
그러나 宋學 以後, 그것은 다시 올라가서
추켜든 손보다 더 높은 데 자리하더니,
開化 日本人들이 와서 이 손과 별 사이를 虛無로 塗壁해 놓았다.
그것을 나는 單身으로 側近하여
내 肉體의 광맥을 通해, 十二指腸까지 이끌어갔으나
거기 끊어진 곳이 있었던가.
오늘 새벽에도 별은 또 거기서 逸脫한다. 逸脫했다가는 또 내려와 貫流하고, 貫流하다간 또 거기 가서 逸脫한다.
腸을 또 꿰매야겠다.
― 서정주 <韓國聖史略>
여기에는 신라 향가 <혜성가>가 모티프로 깃들여 있다. 흉조인 혜성이 신라 땅에 떨어져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융천사는 <혜성가>를 불러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화랑의 사기를 북돋운다. 융천사는 혜성을 길을 쓸어주는 별(道尸掃尸星)로 고쳐 부르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역전시켰던 것이다.
이 시의 머리에서 미당은 그러한 혜성가의 배경설화를 인유하면서, 하늘과 인간, 자연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던 신라를 환기한다. 그러나 고려 이후 송학이 전래되면서 하늘과 인간의 거리를 떼어놓았다. 나아가 일제시대에 와서는 근대주의가 하늘과 인간 사이를 철저한 허무의 벽으로 막아놓았다.
미당은 자신의 시적 작업을 그러한 근대주의에 ‘단신’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적 주체는 끊임없이 송학과 근대주의가 몰아낸 별을 자신의 내면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별과 자아 사이의 교감은 이어지는 듯하면서도 자꾸 끊어진다.
시적 주체를 에워싼 근대주의의 힘들이 주술적 - 고대적인 교감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시적 주체는 근대주의의 강력한 힘에 맞서 끊임없이 일탈하는 별을 끊임없이 자아의 내면으로 끌어들여 관류시키고자 한다. 결국 미당의 시적 작업은 송학과 근대주의에 의해 추방당한 신라인의 정신을 ‘지금 - 여기’의 현실에 복원하는 것이었다.
肉體만이 아닌 靈魂으로 살기로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운 것들을 두고 죽는 섭섭함도 견딜만한 것이 되는 것인 데다가, 이 魂이 영원히 거쳐 다닐 필연의 방방곡곡과 큰 길 좁은 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재미있다.
魂뿐만이 아니라 그 物質不滅의 法則을 따라서 내 死後 내 육체의 깨지고 가루 된 조각들이 딴 것들과 합하고 또 헤어지며 巡廻하여 그치지 않을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아울러 큰 재미가 있다.(중략)
物質만이 不滅인 것이 아니라, 物質을 부리는 이 마음 역시 불멸인 것을 아는 나이니, 이것이 영원을 갈 것과 궂은 날 밝은 날을 어느 뒷골목 어느 蓮꽃 사이 할 것 없이 방황해 다닐 일을 생각하면 매력이 그득히 느껴짐은 당연한 일이다.
― 서정주 <내 마음의 현황>
서정주는 자신이 생각한 신라정신 - 불교정신을 ‘지금 - 여기’로 소환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미당은 ‘물질불멸의 법칙’이라는 근대과학의 법칙을 끌어들이면서, 신라정신과 근대과학은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질불멸의 법칙은 라부아지에가 확인한 법칙으로 질량보존의 법칙을 의미한다. 이는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전후의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근대 과학의 중요한 토대 중 하나이다.
미당은 육체가 깨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진 물질들 또한 자아의 분신으로 생각하였다. 동시에 혼 또한 물질들과 더불어 혹은 물질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우주를 순회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미당의 상상력의 체계에서 자아는 무수히 많은 혼과 물질로 나뉘어 우주를 순회한다. 혼과 물질의 끝없는 순회과정에서 자아는 무생물·식물·동물·인간 등 무수히 많은 양태로 윤회전생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아와 우주의 만물은 혈연관계를 맺게 된다. 그와 같은 미당의 고유한 불교사상은 자신의 표현에 따라 ‘중생일가관(衆生一家觀)’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옥성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2003년 <문학과경계> 진주신문 가을문예에 소설로 등단.
2007년 <시를사랑하는사람들>에 시로 등단.
학술서로 《현대시의 신비주의와 종교적 미학》 《한국 현대시의 전통과 불교적 시학》 등.
현재 서울대학교 강의교수.